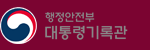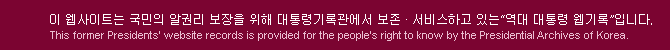히어로에게 물으라.
차 수 민
경상남도 창원시
동네 구봉산을 오르는 데도 길은 여러 가지다.
아파트를 지나 가파른 지름길로 오르는 길, 물웅덩이를 돌며 소금쟁이가 그리는 무늬를 보며 걷는 길, 사람들이 뜸한 외길을 살펴 오르는 길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오름길은 여름엔 소금쟁이를 따라서 가을에는 이름 짓기도 어려운 고운 낙엽이 내리는 물웅덩이를 지나는 길이다.
이렇듯 우리 삶들은 다 저마다의 방식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아마도 내가 지향하는 삶도 또 우리 부모가 지향했던 삶도 그랬을지 모른다. 지금 할 이야기는 내 고향 마을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인 셈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 속엔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도 스며들어 있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내 어린 시절에는 과수원이 있는 집이나 마을에 잘 사는 유지, 점방 딸린 집이 아니면 다 먹고 살기 힘들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여서 점심 도시락으로 밥 위에 달걀을 얹어 오는 친구들을 나는 부러워했다. 또 가끔은 고구마나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는 때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다.
그 날도 막 학교에서 돌아와 툇마루에 앉았다. 시골집에는 바로 옆에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곤 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고방에서 쌀을 탈탈 털어 담은 봉지를 그 사람 손에 쥐여 주셨다. 짜랑짜랑 어머니의 잔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아이고, 제정신이가. 먹을 쌀도 없는데 그걸 주면 우리는 어쩌라고......”
어린 나는 그런 아버지가 미웠다. 어른이 되면 남이야 어떻든 자기 것부터 잘 챙기는 냉철한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이후로도 아버지는 자신이 추천받은 일자리를 사촌 동생에게 양보하는 등 나를 더욱더 실망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먼저 손을 내미는 아버지가 싫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를 이롭게 해야 내 아버지이지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아버지라고 또 믿을 수 없는 아버지라 단정 짓던 때였다.
그래서 나와 내 동생들은 어머니의 이러한 넋두리를 인기 가요인 양 듣고 살았다.
당신은 아무 생각도 없소?
우찌 이리 합니꺼.
말컨 남 다 퍼주고
배를 곯려 자식들 고생시키고
자식들 금처럼 여기면 뭐합니꺼
어중간이
호강도 못 시키면서
왜 그랍니꺼
배가 불러야지요.
이제는 흰 머리칼 무성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 어릴 때 어머니의 안타까운 맘을 조금은 헤아려 본다. 이 글을 쓰면서, 어머니에게 살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는지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는 어릴 때 우리가 듣기 싫어하던 인기 가요를 또다시 들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의 그 다정함을 지울 수 없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자식을 아끼셨다. 우리가 좋아하는 호래기 철이면 새벽같이 먼 길을 가서 구해 오시던 아버지, 큰 조가비처럼 생긴 바지게에 어린 나를 태우고 바닷길을 걸으며 노래를 불러 주시던 아버지를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동네에서 영특하다고 소문난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같지 않은 농사짓고 살면서 얼마나 꿈과 이상 사이와 현실을 방황하셨을지 짐작이 간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우리 배는 곯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사랑은 곯리지 않으셨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부족하나마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리라.
때가 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바다 건넛산 밭에 아버지는 고구마를 심어 우리를 키우셨다. 연보라색 고구마 꽃이 핀 이랑에 걸터앉아 옛 노래를 부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이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젖는 뱃사공’ 하시며 바다를 앞에 두고 구슬피 또 맛나게 소리하시던 아버지는 고구마 꽃의 꽃말처럼 내게 행운이셨다고 말하고 싶다.
자식 사랑도 다른 사람 사랑도 많았던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무뚝뚝하셨다.
다정한 말 한마디도 감동할 만한 손길도 없는 어머니가 늘 나는 불만이었다. 어떨땐 잔정이 없어서 메마르게 사시는 방식이 짜증이 날 때가 있었다. 살가운 면이 없고 그저 무덤덤한 어머니의 성격이 청소년기의 흔들리는 내 삶을 더 견고하게 또는 더 좋게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지 못했다고 내면 깊숙이 원망하는 맘이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의 성격 탓인 것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정 많은 아버지를 대신한 삶의 처신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난 어머니에게 불편한 맘이 있었다. 그건 내 또래 여자아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었을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넷째 딸인 내 밑에는 남동생이 둘 있다. 어릴 때 떠도는 이야기처럼 어쩌면 나는 어느 어두컴컴한 다리 밑에 버려진 아이인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서운한 일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그렇게 애틋하면서도 딸인 나에게는 무심한 듯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어린 내가 잘하려고 애쓰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식상한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시는 어머니께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난 이야기를 푸셨다.
어머니는 내 고향과 좀 떨어진 마을에 부잣집 딸이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의 아버지께선 딸은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남아선호에 최고봉이셨다. 큰 딸이신 어머니는 늘 조마조마 어린 시절을 보냈고 딸로 태어나 제대로 집안의 맏이 대접을 못 받으셨다. 거기다가 출가해서 딸만 내리 낳으신 어머니가 친정에라도 가면 아들 못 낳은 죄를 물으시며 역정을 내셨다고 한다. 내 어머니의 삶 속에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림자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우리는 보이는 모습이 다인 것처럼 내 생각을 더 하여 상대를 이해하곤 한다.
내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살아온 길을 보면 내가 서운해했던 남아선호 사상은 어머니에겐 오히려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 시대를 사는 한 여인의 방식이었다. 단지 이제는 내 부모의 모진 삶이 그리고 펼쳐지지 못하고 구겨진 어머니의 꿈들이 한숨으로 다 새어 버려서 안타까울 뿐이다.
마루에 걸터앉으신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갓 태어난 니를 방구석에 밀치고
미워서 몰라라 했다.
한참을 지나
보자기를 들쳐보니 눈알이 초롱한기라
죽지 않아서
젖 물리가
이리 안 컸나
참 미안하다
부모가 되어 가지고
딸 셋 내리 낳고
일곱 해가 지나
생긴 니가 아들일기라 믿은 기라
그래서 더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는 고향 집 남새밭에 환한 참취 꽃을 닮으셨다. 점박이 다홍 색깔 나리꽃이 도드라지게 화려해도 나는 참취 꽃 모습에 그 향기에 더 행복하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평가할 수 없다. 그저 그때에는 그러한 삶이 있을 뿐이었다. 부모는 내게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만 있어도, 시냇물처럼 내 옆에 흐르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존재이다.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할 때 물 아래 그림자처럼 작은 바람에도 마음도 속눈썹도 떨린다.
구봉산 오르다 물웅덩이 옆에 잠시 쉬었다가, 그냥 오기 아쉬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니셜을 새기고 오는 엉뚱한 아줌마이다. 또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작은 딸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후 “엄마, 나 요즘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 걸까?”라고 후회한다. 우리 삶은 그렇다. 날개를 접고 앉는 나비처럼, 날개를 펴고 앉는 나방처럼 삶은 다르고 나쁘고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본연일 뿐이다. 이 글을 쓰며 부모인 내가 아이들을 보는 시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엄마의 현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느낀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안 된다 또는 잘못되었다고 윽박지를 수 없는 것인 공유이다. 지금 내 삶은 아이들이 볼 때 어떤 삶인가? 또 이 삶은 지금 나의 부모가 보실 때 어떠한가?
지금 내가 고민하는 답을 구할 수 없겠지만, 이번 여름휴가는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 간다. 오롯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계신 히어로 나의 히어로 말이다. 내게는 아직은 물어볼 사람이 있다.
고구마 꽃, 참취 꽃을 보고 있노라면 한낮인데도 환한 꽃잎에 이슬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