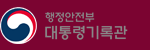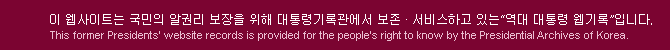전국 청소년 말 문화 개선 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미안해, 괜찮아
장현솔
벌써 30분 째 피곤한 입씨름 중이었다. 서로 바락바락 악을 쓰며 노려보는 꼴이, 흡사 ‘동물의 왕국’ 중 한 장면 같았다. 하필 바로 옆에 거울이 놓여 있어서, 화를 내며 발을 탕탕 구르다 고개를 조금이라도 돌린다 치면 곧장 볼 성 사나운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선,
“그래서 넌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맨날 이런 식이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넌 왜 자꾸 주제를 빗나가? 지금 우리가 그 얘기 중이었냐?” 하고 따지고 드는 게 말이다.
화해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은 벌써 사라져 버린 지 오래였다. 이제 우린 잡아먹을 듯 서로를 째려보며, ‘누가 이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었으니까. 여느 말싸움이 그렇듯 시작은 참 단순했다. 가만 생각하면 또 이렇게까지 이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싶으면서도, 자꾸만 내 앞의 네가 잘못을 부정하려 드는 것이 내 심기를 긁어대는 거다.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다.
“진짜 짜증난다.” “뭐? 내가 짜증나?”
무심코 바글바글 끓던 진심을 뱉어 버리자 그걸 놓치지 않고 물어뜯어 온다. 내 손으로 기름을 더 부어버린 셈이다. 우리의 사이에 보이지 않게 타오른 불꽃에서, 지독한 연기가 타닥타닥 피어올라 온 몸에 달라붙어 왔다. 너의 혀가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다.
“잘못했다고 사과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말도 꺼내기 전에 몰아붙인 게 누군데 그래? 죽이려 들더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또 한 번 뚜껑이 열렸다. 심호흡을 하며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것마저도 꼬투리를 잡는다. 사람이 말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하라면서.
“네가 내 입장이 돼 봐, 사과할 시간도 없이 쏴 붙이면서 무안하게 만드는데.”
“됐다, 그만해. 시간 낭비 같아. 넌 진짜 답이 없다.”
마지막으로 내뱉은 내 말에, 순식간에 너의 표정이 돌변했다. 그러더니, 이윽고 내 시야를 벗어나 그대로 자리를 박차곤 나가 버린다. 이어지는 커다란 문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멍하니 네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건 둘째 치고, 너무 커져 버린 ‘싸움’에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너와 대화를 나누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손바닥 가득 땀이 배여 왔다. 모든 일의 원흉인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다. 나가 버린 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내뱉어버리곤, 이제와 조금씩 더 크게 닿아 오는 나의 말들도 후회가 무색하리만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말이란 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면서 또 한 번 서슴지 않고 대못을 박고 말았다.
‘넌 진짜 답이 없다.’
그 말에 입술을 깨물던 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당장의 화가 앞서 감정에 치우쳤던 나의 언행은 아마 네 맘속에 평생토록 남아 있게 될지도 몰랐다.
되돌려 생각하면, 꽤나 많았다. 생각 없이 뱉어 버린 나의 말에 네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말이다. 크게 티는 내지 않으면서도, 가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던 너였다. 그런 날엔 꼭 내 말, 하나, 하나에 넌 곧잘 예민해지곤 했다.
네가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린 매일같이 싸워댔을 거다. 오늘의 넌 아마도, 그간 네가 늘 많이 참아왔다는 것을 힘겹게 보여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참 전 먼저 네게 악을 쓴 것도 나였고, ‘이기적인 것’도 나였다. 함부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만큼 경솔한 짓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질러버린 내가 오히려 ‘답이 없었다.’
문자를 보내려 하는데, 왠지 모르게 겁이 났다.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을 해 버렸으니까. 아무리 덮어보려 안간힘을 써도, 이미 네게 박아놓은 못은 뽑아내도 그 흔적은 남을 게 분명했다. 크기가 어떻던, 넌 순간순간마다 내 모습을 보며 얼떨결에 그 상처를 생각해 낼 것이다. 문득 마음이 쓰라렸다.
문자를 지워버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귀에 가져다 댄 휴대폰에서 고요한 수화음 만이 들려왔다. 한참동안이나 이어지는 단정한 음에 식은땀이 다 흘렀다.
“…여보세요?”
받지 않을 줄 알았던 네가 목소리를 들려줬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망설이는 날 알아차렸는지, 저 너머에서 다시금 네가 입을 열었다.
“왜 전화했어.”
“미안해.”
그리고 난 정말이지, 너에겐 처음으로 건네 보는 것 같은 말을 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다.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너 상처 받았을 거 잘 알아. 이기적인 건 나였어.”
문득 목이 메어 왔다. 바싹 말라오는 목에, 없는 침을 모아 삼키던 그 순간 나지막한 너의 목소리가 귓속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괜찮아.”
심장이 다시금 커다란 소리를 내며 뜀박질하기 시작했다. 다시 갈게. 기다리고 있어. 넌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테이블에 쓰러지듯 엎어져선, 휴대폰을 꼭 쥐었다.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진심을 담은 말은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다시 돌아온 네가 날 보며 가볍게 웃어 보일 때에 비로소 와 닿은 사실이었다. 후회가 깊어지기 전에, 상대의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말이다.
지금 와 돌이키면 사소하지만 그 때의 우리에겐 너무도 크게 닿았던 그 날의 넌, 나로 하여금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법을 알게 했다.